“병든 사람으로 한증소(汗蒸所)에 와서 당초에 땀을 내면 병이 나으리라 하였던 것이, 그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흔히 있게 된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널리 물어보아, 과연 이익이 없다면 폐지 시킬 것이요, 만일 병에 이로움이 있다면, 잘 아는 의원을 보내어 매일 가서 보도록 하되, 환자가 오면 그의 병증세를 진단하여, 땀낼 병이면 땀을 내게 하고, 병이 심하고 기운이 약한 자는 그만두게 하라.” 하였다.
- 『세종실록』 세종 4년(1422) 8월 25일
한증(汗蒸)은 뜨거운 증기 혹은 열기로 땀을 내게 하는 치료법으로, 한증소는 오늘날의 찜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의 위 기록을 통해 한증소에 대한 세종의 의견을 엿볼 수 있다. 찜질방인 한증소(汗蒸所)는 조선 시대 질병 치료 차원에서 선호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체질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졌으며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의학적 지식이 짧은 사람으로부터 의료찜질을 받다 쇠약해져 죽는 사례도 있었다. 위 기록은 종종 발생하는 그런 불상사를 보고 받은 세종이 찜질방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종의 명이 내려진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10월 2일 예조의 보고가 올라온다.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과 도성의 한증소에서 승려가 병의 증상과 관계없이 찜질을 시켜 환자들을 죽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예조에서 보고하기를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과 서울 안의 한증소(汗蒸所)에서 승인(僧人)이 병의 증상(證狀)은 묻지 않고 모두 땀을 내게 하여, 왕왕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니, 이제 한증소를 문밖에 한 곳과 서울 안에 한 곳을 두고, 전의감(典醫監)·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의 의원을 한 곳에 두 사람씩 차정(差定)하여, 그 병의 증세를 진찰시켜 땀을 낼 만한 사람에게는 땀을 내게 하되, 그들이 상세히 살피지 않고 사람을 상해시킨 자는 의원과 승인(僧人)을 모두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고, 동·서 활인원과 서울 안의 한증소는 그전대로 두기로 명하였다.
-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1422) 10월 2일
사건을 보고 받은 세종은 진단에 소홀한 의원과 승려를 처벌했으나 동서활인원과 도성의 한증소는 유지 시켰다.
초기 한증소는 승려들에게 병자들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을 한증승(汗蒸僧)이라 하였고, 이곳을 관리하는 승려들은 특별히 군역을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한증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활인원은 대민 의료기관의 하나인 혜민서와 달리 환자 혹은 기민(饑民)을 수용, 치료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는 이곳에 설치된 한증소 운영을 위해 숯과 땔나무 등을 지원하였다.
증법(蒸法)
땀을 내는 방법이다. 땔나무를 땅 위에서 태운다. 좀 지난 뒤에 불은 쓸어버리고 약간의 물을 땅에다 뿌린다. 잠사, 복숭아 잎, 측백나무 잎, 쌀겨 및 보리짚 등을 모두 쓸 수 있는데 땅 위에 2~3촌 두께로 깐다. 자리를 펴고 그 위에 이불을 덮고 땀이 날 때까지 누워 있는다. 너무 뜨겁지 않게 해야 되니 마땅히 몸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 온몸에서 땀이 나면 좋다.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땀이 나면 뒤에 분을 발라서 땀이 지나치게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상한문(傷寒門)-땀을 내야 하는 증상」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은 세종대에 편찬된 향약과 한의학에 관한 책으로 우리 산야의 약재인 향약(鄕藥)을 서술하고, 병의 원인과 처방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 책에서 한증(汗蒸)은 상한(傷寒)의 치료법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1481) 2월 27일 기록을 보면 대왕대비(大王大妃)의 한증(汗蒸) 때문에 3대비가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경복궁에도 한증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한증소 구조를 설명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한증소를 조사한 결과 대개 돌을 쌓고 외벽에는 진흙을 발라서 마감하였으며, 돔보다 대략 6척 높은 배기실이 있어 불을 땔 수 있게 하는 구조였을 것으로 보인다.1) 조선 후기에 이르면 한증소는 민간으로 퍼져 성행했는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자신의 저서인 『흠흠신서(欽欽新書)』에서 “서북에는 한증(汗蒸)의 방법이 있는데, 땅을 파서 움집을 만들고 돌을 깔아 마루를 만들고 아궁이(煖炕)를 내서 땔나무를 태워 쇠붙이를 달구듯이 불을 지핀다. 흙으로 만든 집을 단단히 밀폐하여 구멍이 하나도 있지 않게 한다. 이내 병자를 들여보내 땀을 내게 하는데, 기운이 답답하고 땀이 흥건할 때 움집을 나와 바로 얼음물로 들어가면 정신과 기운이 상쾌해지고 병이 씻은 듯이 사라진다.”고 하여 지방에서도 성행하고 있던 한증소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한증소와 관련해 주목할 재료가 바로 황토(黃土)이다. 일찍이 산릉이나 사직단과 같은 왕실 건축 재료로 쓰였으나 여러 의학 관련 문헌을 통해 약재로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재로써의 황토는 복룡간(伏龍肝)으로 아궁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불기운을 받아 빛깔이 누렇게 된 흙이다. 세종은 16년(1434) 6월 5일에 전염병인 역질 치료 처방을 예조에 내리는데 이때 열독(熱毒) 완화 처방 중에 복룡간을 언급한다. 『향약집성방』에도 복룡간의 효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여성의 어지러움, 토혈, 중풍 치료에 활용했다.
황토의 효과는 여러 의학 관련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성질이 평(平)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설사나 적백리, 열독으로 뱃속이 쥐어짜듯 아픈 것에 주로 쓰며 또, 온갖 약독을 풀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아궁이 중앙에 있는 황토(竈心土)는 습을 말리고 열을 내린다.”라고 하였다. 또한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혈이 엉겨 아프고 죽으려 할 때는 뜨겁게 쪄서 베에 싸서 번갈아 가며 찜질해 주는데,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였으며 “경풍(驚風)으로 온 몸이 검게 되었을 때 찜질해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험단방(實驗單方)』에는 “전염병을 앓은 뒤에 발과 정강이에 부기가 생겨 굽혔다 펴지 못할 경우에는 고운 모래를 쪄서 덮고 훈증하면 부기가 풀린다. 또는 모래처럼 고운 황토를 쪄서 덮으면 걸을 수 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疏)』는 황토가 냉열로 인한 적백 이질, 열독에 의한 뱃속 통증을 치료하며, 하혈을 멎게 하고, 모든 독을 제거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의림찬요(醫林纂要)』는 음양의 조화, 독소 해소, 어혈 제거, 상처 봉합의 효과를 들었다.
일설에는 광해군 때 대궐 안 어수당(魚水堂) 부근에 세 평 정도의 황토 밀실을 지어 이용하여 종기를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며, 고종 시대 임금의 병 치료에 황토방이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살균력이 있는 황토의 원적외선을 이용한 황토 찜질방은 돌을 쌓은 뒤 황토를 바른 집의 아궁이에 소나무를 때서 내부를 데우는 방식이다. 솔잎을 깔아놓은 열방에 일정 간격으로 드나들며 온몸을 땀으로 적셔 질병 치유를 꾀했다.
황토와 황토 사우나, 황토 제품은 인체에 유용한 면이 많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병의 증상을 고려하지 않은 황토 복용은 위점막 자극,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땀을 내는 치료법인 발한법(發汗法) 역시 체질, 증상에 따라 다르다. 땀으로 노폐물이 나가는 태음인에게 가장 좋고, 땀 배출 후 기의 소모가 심해지는 소음인에게는 좋지 않다. 또한, 흉민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양인에게는 고온다습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것 자체가 금기 사항이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 최충성(崔忠成1458~91) 『산당집(山堂集)』「증실기(蒸室記)」
- 1) 김성수, 「조선 시대 한증 요법의 운영과 변천」『한국과학사학회지 제38권』 (2016).p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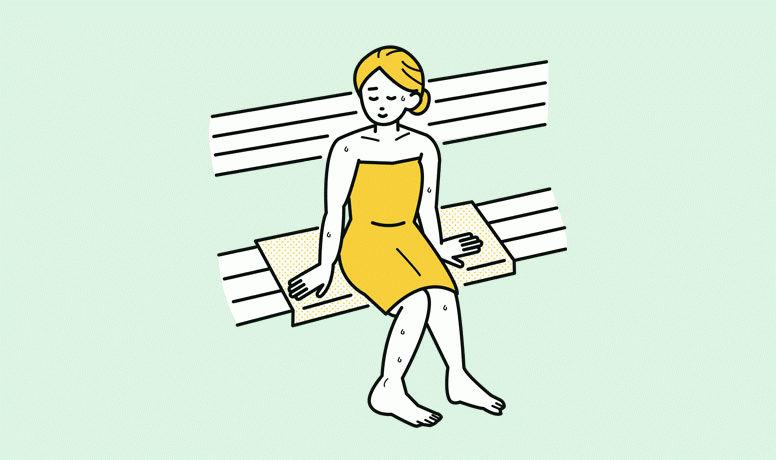




![[현대자동차]<BR>캐스퍼 특별 구매 혜택](../sm-content/upload/kbiz/magazine/69/1152/uti4_post_title.jpg)
![[롯데리조트]<BR>1~2월 프로모션 노란우산공제회](../sm-content/upload/kbiz/magazine/69/1156/uti4_post_title.jpg)
![[삼성전자 복지몰] <BR>새해 삼선전자 세일 페스타](../sm-content/upload/kbiz/magazine/69/1168/uti4_post_title.jpg)
![[서울메디컬]<BR>노란우산 회원 의료 혜택](../sm-content/upload/kbiz/magazine/69/1157/uti4_post_titl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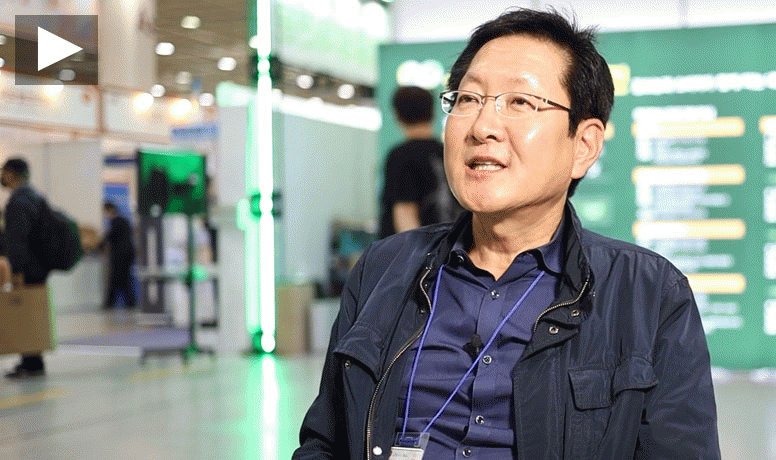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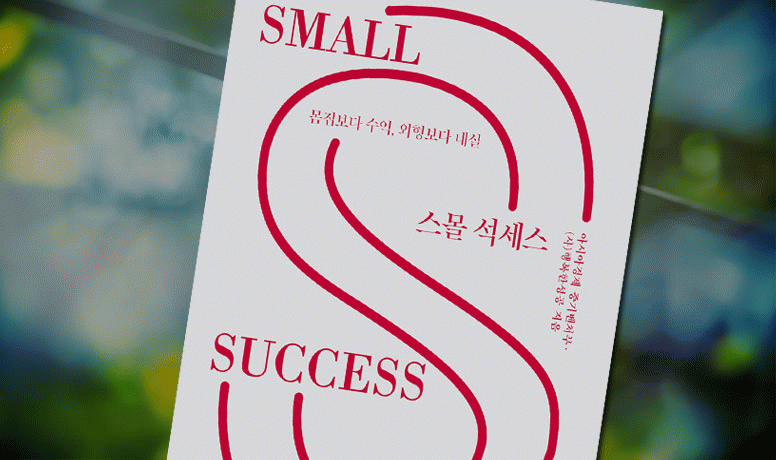
![노란우산과 떠나는 여행 [롯데리조트] <BR>리조트, 골프장 노란우산공제회](../sm-content/upload/kbiz/magazine/69/1169/uti4_post_title.jpg)
